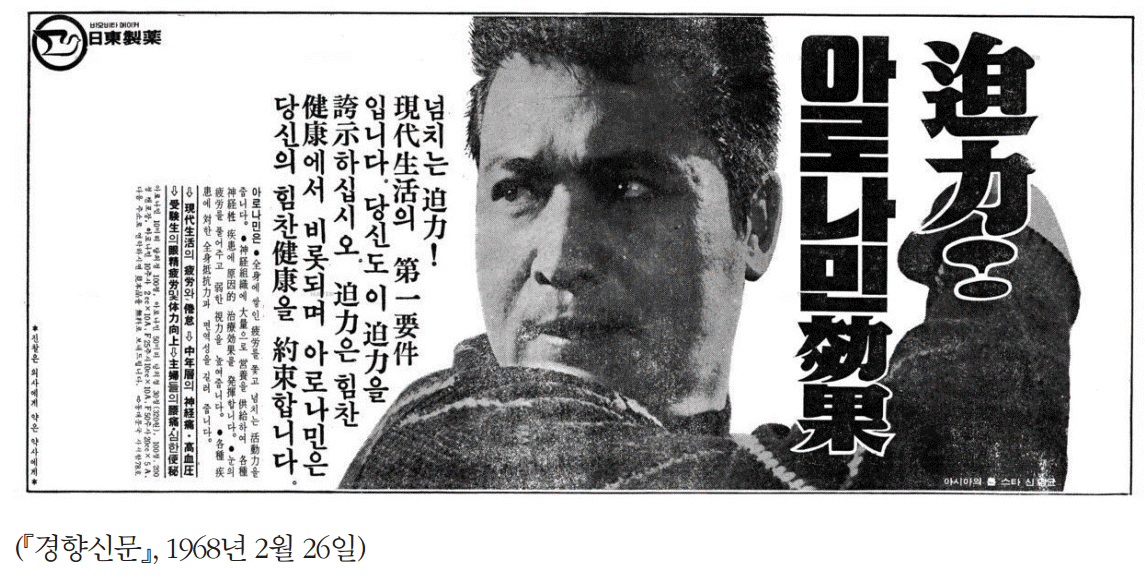1950-60년대 한국 제약산업과 일반의약품시장의 확대*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General Pharmaceuticals Market in the 1950-1960s*
Article information
Abstract
After the Liberation, the Korean economy was dependent on relief supplies and aid after the ruin of the colonial regime and war. The pharmaceutical business also searched for their share in the delivery of military supplies and the distribution of relief supplies. The supply-side pharmaceutical policy made the pharmaceutical market a wholesale business.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led to an increased importation of medical supplies, and wholesalers took the lead in establish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whereas consumers and pharmaceutical business were relatively intimidated.
The aid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after the middle of the 1950s. ICA supplied raw materials and equipment funds, while the pharmaceutical business imported advanced technology and capital. The government invited the local production of medical substances, whereas pharmaceutical businesses replaced imported medical substances with locally produced antibiotics. After the 1960s, the production of antibiotics reached saturation. Pharmaceutical businesses needed new markets to break through the stalemate, so they turned their attention to vitamins and health tonics as general pharmaceuticals, as these were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he modernized patent medicine market after the Opening of Korea was transformed into the contemporized general pharmaceuticals market equipped with the up-to-date facilities and technology in 1960s.
Pharmaceutical businesses had to advertise these new products extensively and reform the distribution structure to achieve high profits. With the introduction of TV broadcasting, these businesses invested in TV advertising and generated sizable sales figures. They also established retail pharmacy and chain stores to reform the distribution structure. The end result was a dramatic expansion of the general pharmaceuticals market. The market for vitamins and health tonics showed particularly explosive growth.
As Korean industrial workers worked night and day to increase exports in the 1960s, they needed vitamins and health tonics for recovery from fatigue and to support vitality. The expansion of the general pharmaceuticals market was accompanied by increases in number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Competition intensified between pharmaceutical companies, leading some companies to search for new survival plan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nderwent structural reform in 1960s, replacing imported medical substances with local products and inventing the new market of general pharmaceuticals. The market for vitamins and health tonics was increased, and a successful product could support a pharmaceutical company. On the contrary, a general pharmaceutical could affect the very existence of the company: if a company chased a popular product and the imitation bubble burst, then the company have lost it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1. 머리말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제약업계는 혼란시대를 경험했고, 1953년 정전협정의 체결과 약사법의 제정으로 한국의 약업은 재건시대로 접어들었다(홍현오, 1972). 약사법 제정의 의도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약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내용은 인적·물적 인프라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구시대의 직업군이 지배하는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었다(신규환, 2013).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약업계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는데, 그와 같은 중요 재원 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공담에 불과했다. 한국의 제약산업이 실질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해외원조가 본격화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제약업계가 점차 생산기반을 갖추기 시작하고, 아울러 1960년대 초부터는 적지 않은 제약업체들이 개별 의약품을 중심으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은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신규환, 2013; 동화약품100년사편찬위원회, 1998; 신인섭, 2001; 예종석, 2009; 김신웅, 1994; 이승욱, 2003; 고승희, 2007). 특히 제약산업의 발전에서 약품광고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Jim Yong Kim, 1993).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개별업체의 성장사에만 관심을 두었지 1950-60년대 제약산업계 전반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마도 개별 자료에 기초한 통합적인 자료 접근에 제약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제약산업이 성장하게 된 핵심으로서 항생제, 소화제, 진통제 등 중요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이외에 비타민과 자양강장제와 같은 일반의약품 시장의 확대와 그 위상에 관심을 두려고 한다. 20세기 중반 한국 제약산업의 규모를 보자면, 항생제, 소화제, 강장제, 해열진통제, 비타민 등의 순서였다. 항생제, 진통제 등과 같은 전문의약품 이외에 비타민, 자양강장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이 대중적인 소비를 본격화하면서 1950-60년대 한국 제약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50-60년대 제약산업의 성장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전쟁 전후 제약업계 상황을 생산, 소비, 유통의 관점에서 의약품시장의 구조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해외원조, 소비시장의 변화, 1960년대 제약업계의 성장신화를 상징하는 아로나민 신화와 박카스 신화 등을 살펴볼 것이다. 아로나민과 박카스는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비타민제와 자양강장제 시장의 대표적인 브랜드였다. 1969년 이후 보건사회부 통계는 비타민과 자양강장제를 ‘대사성의약품[1]’에 포함하여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일반인들은 그와 상관없이 아로나민과 박카스 등을 영양보조제 그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이 연구는 이들 일반의약품 시장의 확대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50-60년대 한국 제약산업의 성장배경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해외원조와 의약품시장의 구조변화
1) 한국전쟁 전후 의약품 생산과 유통
미군정시기 민간 제약업체는 1946년 283개소, 2,456종에서 1948년 340개소, 3,654종으로 증가하였다. 1949년 말경에는 344개의 제약업소에서 3,861종의 약품생산이 이루어졌다(보건사회부, 1958: 212-213). 1947년 의약품 제조업체는 81개이고, 매약 제조업체는 136개였다(대한약품공업협회, 1986: 43). 해방 이후 제약업체가 제조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존하지 않고 시중에서 일반의약품 형태로 팔 수 있는 매약(賣藥)이었다. 매약은 기존 한약재에 약간의 수입약재를 섞은 의약품이었다. 실제로 소규모라도 화학약품을 합성한 의약품인 신약(新藥)을 제조할 수 있는 제약업체는 40여개에 불과했다.
해방 직후 국내 제약업계는 주로 소화제나 자양강장제를 위주로 한 소규모 가내수공업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대규모 사업체들은 적산가옥으로 한국인들이 인수하였으나, 대부분 제약업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인수되었다. 한국전쟁과 1·4후퇴를 거치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기계설비나 자본은 해체되고 말았다. 국내 제약업계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가내수공업 수준의 제약산업을 도약시킬만한 계기가 없었다. 인력, 기술, 자본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갖추질 못했기 때문이다(홍현오, 1972).
1950년대 초까지 의약품다운 의약품을 생산할만한 인력과 시설은 국립방역연구소와 국립화학연구소 등 국가기관에만 겨우 존재하였다. 그나마도 그들은 전염병 예방백신 등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국립방역연구소는 장티푸스, 콜레라, 발진티푸스, 공수병, 광견병, 두창 등 급성전염병 위주로 백신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였다(중앙방역연구소, 1955: 30-31). 1949년 12월, 국립방역연구소는 중앙방역연구소로 개칭되었고, 결핵예방을 위한 BCG 접종과 뇌염예방 백신의 국산화에도 성공하여 방역사업의 획기를 맞이하기도 했다(중앙방역연구소, 1953: 편집후기)[2].
해방 이후 설립된 국립화학연구소는 서무과, 제약과, 검정과, 위생화학과, 영양과, 생약과, 물리화학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제약과는 약품의 제조, 시험, 마약 및 그 제제(製劑)의 분석 및 제조, 제약자원조사, 제약공업기술에 관한 연구, 지도 및 의뢰에 의한 약품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3,]. 흥미로운 점은 해방정국에서 보건당국자들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일부 비타민의 결핍에 대해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군정시기 최제창은 한국인들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대부분의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으며, 단지 빈혈, 구순염,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 B2의 결핍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C. C. Choi, 1949: 125). 국립화학연구소 역시 전국적인 영양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비타민 B 결핍을 파악하고, 멀티비타민의 생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 국립화학연구소가 1950년 5월 멀티비타민의 생산에 나섰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4].
국내 제약업체의 수출입이 본격화된 것은 1949년이었다. 국내 수입약품의 대부분은 한약재였고, 전체 수입의약품(1,215,414달러)의 77.9%(946,276달러)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수입품은 의약품 원료였다. 생산할 수 있는 의약품은 소규모였지만, 전무상태에 가까웠던 이전과 달리 일부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 전체 수출액 728,888달러 중에서 한약재가 85.0%(619,704달러)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수출품은 간유(肝油)와 한천(寒天, 우뭇가사리) 등이었다. 수출입 의약품 중에서 한약재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제약업체가 가내수공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국산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1949년 말 제약업체는 344개이고, 의약품목 수는 3,861개에 달했지만, 국내 제약업체가 공급하는 의약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대한약품공업협회, 1986: 54-55).
전후 제약업계는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대외원조 기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원조품 이외에는 해외의 보따리 상인들이 중심이 된 의약품 밀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페니실린·다이아진 등 미군 군수품과 가오루·인단·노싱·기응환·사론파스 등 일본에서 건너온 밀거래품이 많았고, 마카오나 홍콩 등지에서도 적지 않은 밀수품이 유입되었다. 심지어 소련에서 들어오는 의약품도 있었다. 물론 의약품 원료가 아닌 완제품 형태였다. 부산 국제시장은 의약품을 밀거래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한국전쟁기간 동안 국제시장은 이미 전국에 걸친 의약품 집산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수입품 도매업자들은 의약품시장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제약업체들은 수입의약품 거래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기도 했다. 전문 수입업자 중 의약품을 거래한 대표적인 무역상은 삼성물산, 개풍상사, 천우사, 남창실업 등이었다[5,]. 일부 제약업자들은 국제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 나가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흥일약품, 한국화이자, 한독약품, 국제약품, 한일약품, 세명약품, 삼영화학 등을 들 수 있다(대한약품공업협회, 1986: 67-68).
제약 원료의 부재는 국내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생산하기 어려웠던 중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전쟁 기간 중에도 완제품 수입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제약 원료는 마약이나 부정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관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다. 반면 전후 국산의약품 생산의 저조는 원료나 제조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자와 소비자들의 외제선호풍조에 따른 것이라는 보건당국자의 지적도 있었다[6,]. 그러나 1950년대 중후반까지 수입의약품의 90%는 완제품일 정도로 원료 수입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다[7].
한국전쟁 직후 한국 제약업계가 원료, 기술, 장비, 인력 등 전반에 걸쳐 침체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나마 민간에서 의약품 생산이 가능했던 곳은 미군의 원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납업체였다. 주로 미군의 지정을 받아 주사제와 약전약을 생산했다. 약전약(藥典藥, official drugs)은 정부가 중요 의약품에 대해 그 약품의 제법, 성상, 성능, 품질, 저장법 등을 지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국내 제약업체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군용 의약품으로는 포도당수액, 디아스타제(아밀라제의 약전명, 위장약), APC정(감기약), 건위정(소화제), 머큐롬(소독약), 붕산연고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군납업체로는 유린제약, 신아제약, 동양제약, 서울약품, 고려약품, 신흥제약소, 세브란스약품, 아주약품, 환인제약, 유한양행, 경성신약, 협신제약 등이었다. 이들 군납업체들은 소규모였지만 군납을 계기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는 계림화학, 대한비타민 등이 군납에 참여했다. 특히 계림화학은 링겔을 군납했는데, 이곳에서 바이알병을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이밖에 유한양행, 동화약품, 동아제약, 종근당 등은 민수용 약품을 주로 생산하였다. 전쟁 직후인 1951년부터 1955년 사이에 의약품 생산액은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대한약품공업협회, 1986: 61-66).
195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수입의약품은 약전류 중에서는 스트렙토마이신, 오일 페니실린, 네오살바르산 등이 가장 많았고, 완제품 중에서는 테라마이신이 최대였다. 전쟁 직후 그 가치가 입증된 항생제류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비타민류도 한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보건사회부, 1957).
전후 도매업자들은 의약품 수급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지만, 독점과 매점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기도 했다. 소비자는 도매업자가 물품을 풀지 않으면 원하는 약을 구할 수 없었고, 제약업체로서는 도매업자들의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약품의 판매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이는 국내의 약품의 소규모 생산과 수입의약품의 대규모 유통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의 생산규모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이와 같은 유통구조에 대해 불만을 갖는 제약업체가 늘어만 갔다. 예컨대 제약업체들은 스스로 특약점을 설립하거나 소매약국 등과 직거래하는 등 독자적인 유통망과 판매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제약업계가 생산·유통하는 의약품은 크게 보아 한약, 매약, 화공약품, 수입약품, 기타약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 직후 1950년대 전반까지 의원이나 병원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은 주로 수입약품에 의존하고 있었고, 국내 제약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1천여 명을 넘지 않았고, 1955년까지도 2천여 명을 넘지 않았다. 그나마도 약사면허자의 44%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신규환, 2013: 852).
1950년대 의약품의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약사 이외에도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 등이 있었다. 1949년 이래로 10여 년 동안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던데 비해, 한약종상 수는 감소, 매약상은 현상유지, 약종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49년에는 약사를 제외한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이 전체 약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7%에 이르렀는데, 1957년에는 83.3%로 다소 감소하였다. 10여 년 전에 비해 약사를 제외한 약업자들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약업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한약과 매약을 다루는 약업자들이 1950년대까지도 약업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사실상 일반인들은 이들 약업자들이 공급하는 한약과 매약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보건사회부, 1958: 216).
한약종상은 원칙적으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한약을 조제하도록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간단한 진료와 한의서에 기초한 비방을 제조해 시중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주로 소화제나 원기를 보충하는 보약을 제조하였다(박경용, 2011). 약종상과 매약업자들이 다루는 의약품은 주로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머큐롬, 안티프라민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들이었다. 그러나 1950-60년대까지 빈발하는 부정 매약업자들의 부정약품 수급과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한 빈번한 신문보도는 매약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약업자의 위법적인 활동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8].
2) ICA의 원조와 기술제휴
민간의 의약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대외원조를 통해 가능했다. 해방 이후 의약분야의 최대 원조는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의 원조였다[9,]. ICA가 제약업계의 재건을 위해 원료구입과 시설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운영해왔던 국내 제약업계는 양질의 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밖에도 ICA는 기술원조를 위해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유엔이나 국비 지원을 받은 유학생이 10명 내외였던 것에 비해 ICA는 1955∼60년까지 6년 동안 총 1,725명(미국 1,397명)을 지원했다. ICA가 매년 233명의 유학생들에게 미국 유학을 지원한 셈이었다. ICA의 기술원조 훈련계획은 한국사회에 미국식 문물이 수입되는 주요한 경로였다. 주요 지원대상은 광공업, 농업, 공공행정,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 걸쳐있었다(한진금, 2010: 51-56).
1955년 제약업계에 최초로 지원된 ICA 자금은 46.5만 달러였다. 유한양행, 동아제약, 근화제약, 동양제약소, 서울약품 등 5개 업체에 배정되었다. 유한양행이 가장 많은 15만 달러를 배정받았고, 동아제약, 동양제약소, 근화약품은 각각 8만 달러, 서울약품은 7.5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실제로 1956년 유한양행은 ICA 시설자금의 지원으로 20여종의 기기를 도입하여 약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김신웅, 1994: 221). ICA 2차 자금은 1956년도에 배정되었다. 총 262,341달러가 배정되었는데, 대한비타민, 태양제약, 범양약화학, 신아제약, 서울약품 등 5개 업체에 배정되었다. ICA 3차 자금은 1957년에 배정되었다. 총 42만 달러가 배정되었는데, 유유산업, 합동화학, 동아제약, 유한양행이 각각 10만 달러 내외 배정되었다. ICA자금 이외에 정부에서도 총 6,000만 환을 융자하였다. ICA 4차 자금은 1958년에 배정되었는데, 총 5만 달러였다. 건일약품과 대한비타민 등이 그 수혜대상자였다. 정부에서도 1,800만 환을 융자하였다. ICA자금은 제약업계에 큰 활력을 제공했다. 이 자금을 기반으로 원료를 확보하고 최신 설비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의약품 생산이 가능했다. ICA의 원조가 시작된 1955년도 국내업체의 의약품 생산량은 전년대비 270%가 증가하였다(대한약품공업협회, 1986: 62).
각 업체는 달러를 제공받았는데, 달러 시세만으로도 수지가 맞았고, 원료를 수입하면 원료가 시중가보다 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남는 장사였다. 이것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도 잘 팔려나갔다. 결국 ICA의 원조를 받은 제약업체는 이중 삼중으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부정축재자들과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부정축재관리국의 신설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10]. 제약업체들은 ICA 원조와 항생제 생산에 사활을 걸었다. 당시 의약품시장에서는 오일페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의 수요가 가장 많았고, 수입량도 적지 않았다. 정부의 국산의약품 장려정책에 따라 수입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항생제 시장을 선점하면 다른 품목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ICA 시설자금이 페니실린이나 스트렙토마이신과 같은 항생제 시장에 집중되었고, 이들 품목은 과잉 생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ICA 원조를 받기 위해 각 업체들은 한국은행의 공개 입찰에 참여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불필요한 잡음이 많이 생겨났다. 예컨대, 공개 입찰자들의 순위경쟁과 안정적인 시설자금의 환수를 위해 국채 매입금액을 적어내도록 했는데, 담합을 통해 저가 국채 매입 등이 성행하는 등 업체 간 담합과 경쟁이 치열했다[11,]. 또한 ICA 원조자금은 추첨, 공매 등의 방식으로 선정되었는데, 유엔군 산하 주한 경제조정관실(Office of Economic Coordinator for Korea, OEC), 부흥부, 상공부의 협의로 결정되었다. 초기에는 원조금액의 20배에 이르는 금액이 신청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했고, 각 업체는 OEC, 부흥부, 상공부 등에 정실관계를 총동원하였다[12]. 그러다보니 로비 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나 상이군인협회 등이 의약품 원조자금을 낙찰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의약품의 경우는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던 대한약품공업협회(이하 약공)가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해 오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약관련 원조자금이 제약업계와 관련 없는 업체나 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업체 간의 경쟁을 다소간이라도 완화시켜보고자 했다. ICA 원조 자금의 배분은 약공의 조정안에 기초하여 ICA, 정부, 업계를 대표하는 약공 등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한국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입찰도 약공 명의로 제출되었다. 입찰업체들은 최소한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일정액의 국채를 매입해야 했기 때문에, 중소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아무래도 업계에서 생산능력과 지명도가 높은 업체가 선정에 유리했다. 약공은 자체적으로 원조자금 배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약업신문, 2004: 142-156).
결국 1955년과 1956년 약공의 배정위원회는 업계의 제약생산 능력을 위주로 심사한 결과, 유한양행 등 5개 업체와 대한비타민 등 5개 업체를 각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그 선정 기준을 두고 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일단 원조자금을 수입업계가 가져가느냐, 제약업계가 가져가느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었다. 수입업계는 약공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1957년 5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별도로 조직하였다. 또한 항생제를 위주로 할 것인가와 일반의약품을 위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항생제업계는 1957년 10월 한국항생물질협회를 별도로 조직하였다. 이 모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해 원조자금 배정의 우선권을 얻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었다. 결국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한국항생물질협회 등이 의약품원료와 항생물질 구입자금을 별도로 요구하였다[13,]. 특히 한국항생물질협회는 유한양행, 동아제약, 동양제약, 근화제약 등 ICA 원조자금 선정업체들이 주도하였는데, 업계의 최대 수혜자들이 별도의 조직을 창립하여 남아있는 원조자금까지 독식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ICA 원조자금을 재분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생원료 자금을 별도로 지원받기 위해 한국항생물질협회를 조직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약업신문, 2004: 147).
ICA 원조자금 선정과정에서 자금의 독과점 문제 이외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당초 사업 변경 및 축소, 원조불의 해외낭비, 경쟁미비로 외자기업의 독점현상 가중 등이 감사보고서로 제출되었다[14,]. ICA 원조자금의 집행상의 문제는 언론을 통해 적지 않은 지적을 받았다[15,]. 정부 내의 실적 경쟁과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ICA 원조가 수입의약품을 대체하고 국내 제약산업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었다. 1960년 외자도입 촉진법의 실시로 약품원료의 수입이 원활해지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제약업체 육성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제약할 수 있는 82종의 완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선정하여 해당 약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못하게 하였다. 정부는 일반의약품용과 항생제용 원료수입 비율을 7:3의 비율로 정리하였다. 국산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시행 결과 수입의약품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1958년 444만 7,000여 달러에 달했던 수입약품은 1959년 312만 7,000여 달러, 1960년 278만 3,000여 달러, 1961년 217만 6,000여 달러, 1963년 100만여 달러, 1964년 62만여 달러로 줄어들었다. 대신 약품 원료의 수입량은 증가했다(여인석 외, 2012: 347).
해방 이후 정부는 백신 및 의약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립방역연구소가 1949년 일본뇌염의 원인균을 발견하고 1950년 뇌염 백신을 독자 생산한 것이나 1952년 BCG접종을 독자 개발하여 1955년부터 독자 생산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16) BCG접종의 독자생산으로 수입비용의 20%만으로도 수입 대체가 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947년 국립방역연구소는 장익진 부소장의 주도로 페니실린 배양에 성공하여 페니실린 독자생산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시설과 자본이 부족하여 페니실린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페니실린은 해방 이후 10년 넘도록 최대 수입품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독자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보건당국은 페니실린의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1952년 보건사회부 약정국은 대한 약품공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결국 정부 주도의 항생제 개발사업이 좌절되자, 당국은 민간 주도로 항생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나섰다. 민간으로서는 항생제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계에 부딪쳤다. 1952년 12월 동양약품공업이 페니실린의 배양 및 반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시판까지는 여전히 난항이었다[17].
1950년대 중반 이후 약무당국의 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난립하던 무허가 및 엉터리 제약업체를 일소하고 설비를 갖춘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제약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내 의약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부정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자 하였다. 1955년 4월 보건사회부는 전국 500여 개의 제약회사와 4천 5백여 종의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동년 8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약회사의 설립과 관리가 종래 도지사 허가제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보건당국의 주도 하에 제약업체의 관리와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18,]. 그러나 해를 넘겨서까지도 보건사회부는 제약업체의 수가 몇 개가 되는지 생산약품이 몇 종이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19,]. 1957년 실태조사에서 250개소의 제약회사에서 5천여 종의 의약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중에서 시설을 갖춘 제약회사는 20여 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제약업체는 대다수가 수공업 기반으로 위생상태와 작업환경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20,]. 1958년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327개 제약업체 중 100여개가 설비기준 미달로 이들 불량업체들에 대해서는 설비개선, 영업정지,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21,]. 이렇듯 1957년 말까지 의약품 수입액의 90% 이상이 완제품일 정도로 여전히 적지 않은 원조비가 완제품 구입에 소요되었다[22].
1957년 한독약품은 독일 훽스트사(Hoechst)와 기술제휴를 맺고, 1959년 아빌 정제(항히스타민제), 노발긴(해열진통제), 황산스트렙토마이신 등 5종을 생산하였다(한독약품, 2004: 128-135). 1958년 동양약품과 근화제약은 ICA 시설원조를 바탕으로 테트라사이클린과 스트렙토마이신 등 국내 최초로 항생제를 생산·시판하였다. ICA의 시설원조와 더불어, 제조기술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 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1958년 동양약품은 미국 멀크사와 기술제휴로 항생제를 제조하였다. 이처럼 ICA 시설 원조와 기술 원조를 바탕으로 몇몇 제약업체들이 항생제 등 신형 완제품 생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3. 일반의약품의 생산과 시장확대
1) 의약품 증산과 소비시장의 변화
ICA 자금원조에 의한 자본, 기술, 인력 등의 유입으로 195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제약업계는 커다란 지각변동을 경험했다. 1958년 국내 최초로 항생제를 생산한데 이어, 1963년 이후 제약산업은 매년 34%의 놀라운 신장세를 나타냈다. 의약품 자급율도 95%에 이르게 되었다(보건사회부, 1971: 192). 특히 정부는 항생제의 국산화를 적극 독려하여 적지 않은 제약업체들이 항생제의 생산에 몰두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항생제 생산시설에 대한 과잉·중복 투자로 한 달에 10일 이상 가동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였다(약업신문, 2004: 148).
1949년에서 1959년까지 의약품 생산액을 살펴보면, 신약과 약전약의 생산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고, ICA의 자금지원을 받은 1955년 이후로 신약 생산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약 생산액 역시 증가하였고, 그 비중도 결코 적지 않았다. 1949년 약전약은 26.1만원, 주사제 36.7만원, 매약 121.1만원 등으로 매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약업신문, 2004: 119). 1955년에는 약전약, 신약, 매약의 생산액은 거의 비등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1950년대 중반까지 국내의약품 생산액에서 화장품 생산액이 전체 의약품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실질적인 의약품 제조환경은 열악했다.
해방 이후 1957년까지만 해도 매약 생산액은 신약 생산량을 압도하는 실정이었다. 1950년대에는 부정매약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였으니, 실제로 매약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치를 웃도는 것이었다. 1956년에서 1957년 사이 매약 생산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매약은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였다. 반면 1955년 ICA 자금원조를 바탕으로 신약 생산량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58년부터는 신약 생산량이 매약 생산량을 두 배 이상 압도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의약품 생산량의 추이를 관찰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1950년대 말에 이르러 신약과 항생제 생산이 급증했다는 점과 1950년대까지도 매약 생산의 비중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의 매약 소비가 적지 않았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부정매약 유통, 거리매약 단속, 유사 의료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24].
1958년 항생제가 생산되기 시작한 이후, 항생제의 생산량은 급증하였고, 1959년 항생제 생산량은 매약 생산량을 넘어섰다. 1960년 이후 보건사회부의 통계연표에서 매약 항목은 사라졌다. 이것은 시장에서 매약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의약품 생산에서 약전약, 화장품, 위생재료 등이 여전히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950년대의 약전약, 신약, 매약 위주의 분류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항생제와 신약 생산이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보건통계에 등장하는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에서는 항생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해열진통제, 비타민제 등을 비롯하여,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감각기관용, 알레르기용, 순환기계용, 호흡기계용, 홀몬제, 비뇨기계, 외피용, 혈액 및 체액용, 화학요법제, 구충제, 공중위생용약 등 신체기관별, 기능별 분류가 새롭게 적용되었다. 1960년 이후 항생제 생산은 의약품 생산량에서 거의 수위를 놓치지 않았다. 이로 통해 국산 항생제가 수입항생제를 대부분 대체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항생제 시장은 곧바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매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안정성이 뛰어난 약품으로 몇 가지 간단한 성분을 혼합한 것이다. 매약은 소화제, 위장약, 감기약 등 일상생활에 흔히 상용되는 약품이 주종을 이루며 개항 이후 식민지시기를 거쳐 탄탄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인단, 활명수, 청심환, 조고약 등이 한말 식민지시기의 대표적인 매약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매약은 적지 않은 생산량을 자랑하였고, 매약생산이 최대에 이르렀던 1957년도에 생산된 매약의 종류는 140종에 이르렀다. 생산량이 최대였던 상위 품목으로는 활명수, 치마약(齒磨藥), 연치약, 분치약, 쌍화탕, 생명수, 향은단, 살충액, 지해로 등이다. 활명수, 생명수 등은 소화제, 쌍화탕은 감기약, 지해로는 진해거담제, 향은단은 면역력 증강, 치마약, 연치약, 분치약 등은 치약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오랫동안 시중에서 팔렸던 금계랍, 소합환, 활인소, 우황청심환 등도 여전히 인기품목이었다(보건사회부, 1957: 265-274). 매약은 의사 처방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의 일상생활에서 활용도나 접근성이 높았다. 그러나 매약의 제조는 영세업자들의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졌고, 1개 품목에 대해 매약허가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품목을 바꿔가며 영업을 하였고, 심지어 대리영업을 하는 등 불법적인 매약제조와 유통은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25].
1950년대 중반 이후 의약품 생산에서 신약이 매약을 압도하기 시작했지만, 신약 중 적지 않은 비중이 기존 매약 제품과 다를 바 없는 일반의약품이었다. 예컨대 1959년 최대 생산된 신약은 원기소, 에비오제, APC정이었는데, 원기소는 유산균 제제(製劑), 에비오제는 영양제, APC정은 감기약 등이었다(보건사회부, 1959: 207-211). 이밖에도 1950년대 후반 신약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제품은 헥사비타, 판비타, 유헥사비타와 같은 비타민류, 안티푸라민과 같은 연고제, 하이파스와 같은 파스 등이었다. 말하자면 1950년대 후반 급증하기 시작한 신약이라는 것도 기존 매약과 다를 바 없이 감기약이나 연고제, 파스 등이 많았는데, 다만 영양제나 비타민 등이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급증하게 되어 기존 매약의 지위를 대신해 나갔다. 1950-60년대 제약업체들이 일반의약품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은 온전히 새로운 시장에 눈떴다라기 보다는 기존 매약 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한 덕이었다.
2) 아로나민과 박카스 신화
1960년대는 국내 제약산업의 도약기로 항생제를 중심으로 국산화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의약품 생산 및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외국계 제약회사와 기술제휴나 합작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했다(유경수 외, 2002: 29).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내 의약품 시장을 장악했던 것은 수입의약품 도매업자들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수입의약품을 대체하기 위해 의약품의 국산화정책을 유도했고, 수입의약품 도매업자들은 점차 위축되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들은 도매상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소매약국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아제약이 도매상의 전횡에 대항하여 독자적으로 소매약국과 특약점을 개설한 것이나 보령제약이 소매약국인 보령약국을 발판으로 성장한 것 등이 이와 같은 흐름에서 생겨난 것이다(신인섭, 2001: 73-77; 김승호, 2000: 40)[26].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약품광고를 통해 약효를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선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약업체들은 약품 개발비보다 광고비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은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다. 오랜 영양실조로 국민들은 일종의 건강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다. 원래 비타민은 미군의 구호물자 중의 하나였는데, 비타민의 대량 유통 가운데 비타민을 무조건 좋아하는 풍조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아가 비타민만 먹으면 식사를 걸러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신념까지도 낳았다(신인섭, 2001: 45).
1950년대까지 다양한 비타민제가 합성된 종합비타민과 미네랄이 첨가된 복합비타민 제제(製劑)가 유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타민에 피로회복제를 첨가한 자양강장제 역시 인기였다. 그런데 당의(糖衣)로 포장된 일반 종합비타민은 복용 후에도 흡수율이 높지 않고,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비타민 제제를 비타민 C나 비타민 B 등 단일제제로 분리시키는 것과 장에서 쉽게 파괴되지 않고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 상태의 비타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활성비타민(activated vitamin)은 일반비타민에 비해 장에서 흡수가 잘되고, 일반비타민은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10mg 이상 흡수하지 못하는데 비해 활성비타민의 흡수율은 4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이미 일본에서 활성비타민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시장에서도 활성비타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은 명약관화했다. 일본 제품은 맛이 쓰고 마늘 냄새가 강했는데, 국내 제품은 쓴맛이 없고 냄새도 약했다. 신제품 개발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27]. 1960년대 이후 종합비타민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활성비타민과 피로회복제(혹은 강장제)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을 대표했던 약품이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과 동아제약의 박카스였다.
일동제약에서는 1959년 유산균 제제인 비오비타를 출시하였다. 비오비타는 싼 가격 탓에 일동제약으로서는 수익이 크지 않은 제품이었다. 일동제약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1963년 7월 지속성 활성비타민인 아로나민을 발매하였다. 아로나민은 푸로설티아민(TPD)과 리보플라빈을 주성분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된 활성비타민이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이어 프루설티아민(활성비타민B1), 낙산리보플라빈(활성비타민B2), 인산피리독살(활성비타민 B6), 초산히드록소코발라민(활성비타민B12) 등 활성비타민 B군에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강한 아로나민 골드가 1970년 4월에 발매되었다.
아로나민 시리즈가 롱런할 수 있었던 데는 광고의 효과도 컸다. 회사 매출의 25%를 아로나민 광고에 투자할 정도였다. 발매 초기인 1966년 6월 프로권투선수인 김기수 씨의 세계 주니어미들급 타이틀 매치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펼쳤다. 프로모션에는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권투시합의 승리는 아로나민의 효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체력은 국력’이 아로나민의 슬로건이 됐다[28]. 이를 통해 아로나민은 비타민 시장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아로나민 광고가 처음부터 체력과 국력만을 강조했던 것은 아니었다. 발매 초기만 하더라도 “참된 행복은 건강에 있다”며 여성 모델을 전면에 앞세웠다. TV광고와 스포츠를 결합하면서 아로나민의 남성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 아로나민은 영화배우 신영균을 통해 남성의 박력과 체력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 이후로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가 부가되었고, 아빠의 피로 회복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이후아로나민 광고에서 피로회복의 주체는 남성 혹은 아빠에서 가족으로 전환되었다.
아로나민의 성공으로 활성비타민 시장은 과열화되기 시작했다. 1964년 불과 반 년 사이에 10여개의 유사제품이 등장했다. 푸로나민, 옥소라민, 하아나민, 아리랑V, 아리타민, 코리나민, 프리마, 바이페라, 베지나민, 스테미나 등이 그것이다.
활성비타민의 성공과 더불어 피로회복용 자양강장제 시장 역시 팽창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자양강장제는 삼일제약의 에비오제와 서울약품의 원기소였다. 에비오제와 원기소가 보건통계에 등장하는 것은 1956년인데, 1959년에는 신약 중에서 최대 생산량을 나타냈다(보건사회부, 1959: 207-211).
1949년 8월 설립한 동아제약은 전후 항생제 생산에 진력하다가 자양강장제 시장의 팽창에 주목했다. 동아제약은 1961년 9월 ‘박카스정’을 시판하기 시작하였고, 박카스정을 포함한 자양강장제는 1960년∼1964년 사이에 95∼127배 성장하였다. 같은 시기 각종 비타민제도 16∼99배 성장하였다(신인섭, 2001: 47, 표1).
한창 잘 나가던 박카스정에 위기도 있었다. 1962년 봄, 박카스 정제(錠劑)의 당의정(糖衣錠)이 녹아내리면서 대규모 반품사태가 벌어졌다. 당의의 기술문제는 곧 해결되었지만, 제품 이미지에는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 마침 1962년에는 드링크제인 동인화학의 ‘동인구론산’과 천도제약의 ‘단발구론산’이 발매되어 인기를 얻고 있었다. 결국 동아제약도 이런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962년 8월 20㎖ 앰플 ‘박카스 내복액’을 시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앰플은 파손될 우려가 높았고, 소비자로서는 앰플을 따는 것도 불편했다. 심지어 주사제로 착각을 하여 주사액으로 사용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하였다. 드링크제로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있었다. 때마침 산업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졌고, 1963년 4월 100㎖ ‘박카스디’가 시판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박카스정, 박카스 내복액, 박카스디 등 세 종류의 박카스가 생산되었고, 이와 더불어 동아제약은 대량광고와 대량판매에 나섰다.
박카스의 주요 광고 컨셉은 생명력과 젊음이었는데, 코미디언 김희갑과 영화배우 남미리 씨가 TV광고와 신문광고에 등장하였다. 박카스 광고는 그밖에도 식욕증진, 피로회복, 음주전후 해독, 피부미용, 간장기능 강화, 연탄가스 중독 해독에 이르기까지 가히 만병통치약 수준의 약효를 선전하였다[29,]. 박카스가 내세우는 젊음, 활력, 전투 등의 이미지는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주는”사회적 분위기에도 잘 부응하였다[30,]. 1963년에 박카스디는 1,423,393병을 생산했는데, 1970년에는 76,162,998병으로 무려 54배 신장하였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3,638만원에서 24억 2,596만원으로 67배 증가하였다(신인섭, 2001: 45-71).
1966년 박카스디의 생산실적은 국내 전체 의약품 생산실적의 10%대를 넘기 시작했고, 1967년에는 17억 1,273만원으로 국내 전체 의약품 생산실적 125억 2,496만원의 13.7%를 차지하였다. 단일품목으로 국내 제약시장을 석권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신인섭, 2001: 77-79).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난립하던 제약업체들이 점차 정비되었다. 1964년 482곳에 이르던 업체 수는 1966년 349곳, 1970년에는 286곳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65년 메사돈 사건 이후 정부의 부정의약품 관리 강화와 제약업체 사이의 구조조정 국면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1967년에 이르러 대규모 시설을 갖춘 업체가 늘어나면서 약품 생산의 과점현상이 나타났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 제약회사들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져 10억 이상 생산하는 28개 업체의 생산액이 1,190억 원을 기록, 전체의 82%를 차지하게 되었다.
박카스디의 성공은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던 당시의 사회 풍조와도 잘 맞아 떨어졌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개발독재와 더불어 시작된 잘살기운동과 수출역군의 체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장시간 노동을 지탱해 줄 각성제가 필요했다. 체력과 의지의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일종의 과장 광고였다. 다만 박카스디에는 카페인 성분을 통한 각성 효과가 있었는데, 장시간 노동조건을 견뎌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의 요인이었다(Jim Yong Kim, 1993: 35).
박카스디 이외에 일반의약품 시장의 자양강장제 신화를 낳았던 제품들로는 일양약품의 원비디와 대웅제약의 우루사 등이 있다. 원비디는 1962년 시판되기 시작하였고, 인삼을 주성분으로 하였으며, 박카스디의 아성에 도전한 유일한 드링크제였다. 우루사는 원래 1961년 부산에서 창업한 대한비타민산업이 개발한 대표 상품으로 정제(錠劑)로 되어 있었으나 1966년 윤영환이 인수하여 새롭게 발전시켰다. 1970년대 대한비타민산업은 대웅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우루사는 대웅제약의 대표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자양강장제 제품시장의 확대로 자양강장제 생산량은 1970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4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보건사회부, 1960-1970). 자양강장제와 비타민제 시장규모를 비교하자면, 1960년대 중반 이후 자양강장제가 비타민 생산액을 넘어서고 있었다(보건사회부, 1960-1970; 신인섭, 2001: 47).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보건사회통계연보』에 나타난 국내의약품 생산량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비타민이 국내 제약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58년 국산 항생제가 시판된 이래로 1960년대에는 1961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항생제 생산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다. 해마다 순위상의 변경이 있었지만, 총액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항생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해열진통제, 비타민제 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1위와 5위의 격차가 2.3배 정도로 품목별 생산량의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도 국산의약품의 생산액 순위는 1960년대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1위와 5위의 격차가 점차 커져 1위 항생제와 5위 비타민의 격차는 4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는데, 그 후로는 줄곧 5위를 자리를 고수해왔던 비타민이 순환계용약과 외피용약 등에 그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비타민의 생산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비타민 생산액은 10위권 밖으로 강등되었다(보건사회부, 1957-1996).
4. 맺음말
해방 이후 한국경제는 식민통치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구호물자와 원조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약업계 역시 군수물자 납품과 구호물자의 분배 속에서 살길을 모색해야 했다. 1940~50년대 공급위주 의약품정책은 도매상 위주의 의약품시장을 형성하게 했고, 수입의약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도매업자 위주로 유통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병원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매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원료와 완제품을 장악한 도매업자의 역할과 규모는 커진데 비해, 제약업자와 소비자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제약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은 ICA의 원조였다. ICA원조는 소수 특정업체에 배정되어 각종 특혜시비와 각종 이해단체의 이합집산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 그러나 ICA는 제약업계에 원료와 설비자금 등을 원조하였고, 제약업계는 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의약품의 대량생산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의약품의 국산화를 유도하였고 제약업계는 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 테라마이신, 네오살바르산 등 항생제 생산을 통해 당시 최대 수입의약품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1960년대 들어서면서 제약업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항생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의 생산만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었다. 의약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대량판매와 대량소비를 촉진시킬 신제품을 필요로 했다. 제약업체는 기존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의 매약 업체들이 생산해왔던 소화제나 감기약과 더불어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등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적합한 품목에 주목했다. 제약업체들이 이들 일반의약품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은 기존 매약 시장에서 보여준 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항 이후 ‘근대화된’매약 시장이 1950년대 중반 이후 해외원조를 통한 기술, 자본, 설비 등에 기반하여 ‘현대화된’일반의약품 시장으로 변모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타민과 자양강장제는 해방과 전쟁 이후 구호물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익숙한 제품이기도 했다. 비타민과 자양강장제로 영양결핍을 만회할 수 있다는 신념도 비타민과 자양강장제의 성공을 뒷받침했다. 제약업체는 생소한 브랜드의 의약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통해 친숙도를 높이고, 기존의 도매업 위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했다. 1960년대부터 TV방송까지 등장하면서, 제약업체는 TV를 중심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극장, 옥외광고 등을 통해 매출의 절대 다수를 광고에 투자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특약점이나 소매약국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감기약, 소화제, 활성비타민제제 등 일반의약품 시장은 점차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제제와 자양강장제 시장은 폭발적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196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개편되면서 국민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출역군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비타민과 자양강장제는 그들에게 피로를 개선하고 활력을 가져다주는 필수품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하였다. 일반의약품 시장의 확대과정에서 제약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몇몇 인기품목의 과점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제약업체는 스스로 구조조정 국면을 맞이하였다.
1960년대는 한국 제약업계의 구조개혁기였다. 전후 수입의약품 시장을 국산의약품으로 대체해 나갔고, 대량생산에 기반하여 대량소비 품목이 고안되었다. 조국근대화에 따른 산업역군들의 피로회복을 뒷받침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산업역군들이 피로해질수록 건강에 대한 욕망은 비대해졌다. 비타민과 자양강장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한 두 개의 히트상품만으로도 제약업계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도매상 위주의 유통시장이 소매약국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반면 전문의약품 위주의 의약품 생산과 마케팅에 적극적이지 않은 소규모 제약업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제약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유행하는 품목을 쫓아 비슷비슷한 일반의약품을 양산하였다. 한두 가지 일반의약품만 성공시키면 업계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경영방식은 업계의 성공신화 이면에 깔려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 같은 제약업계의 생존방식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한 것이기도 했다.
Notes
대사성의약품(代謝性醫藥品: Agents affecting metabolism)이란 세포내의 대사와 그 조성물인 당과 지질의 대사를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는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혈액·체액용약, 인공투석약 등을 포함한다. 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을 기타 대사성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통풍치료제, 면역억제제, 당뇨병용제, 고뇨산혈증치료제, 대사부활제, 인슐린분비억제제 등이 포함된다.
1945년 9월, 체계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조선방역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1945년 10월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국립방역연구소로 개칭되었다. 1949년 12월, 국립방역연구소가 중앙방역연구소로 개칭되었고, 1959년 12월 국립방역연구소로 환원되었다. 1963년에는 국립보건원으로 통합되었으며, 1967년 국립보건연구원, 1981년 11월 국립보건원 등으로 개칭되었다. 2004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서무과는 인사관리, 공문서관리, 각과의 종합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약과는 약품의 제조, 시험, 마약 및 그 제제(製劑)의 분석 및 제조, 제약자원조사, 제약공업기술에 관한 연구, 지도 및 의뢰에 의한 약품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검정과는 약품검사, 유해물질의 분석·감정·시험 및 약품규격에 관한 조사·연구·결정 등을 담당하였다. 위생화학과는 환경과 노동위생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위생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수질과 공기에 대한 검사 및 의뢰에 의한 수질, 공기의 시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영양과는 음식물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영양가측정, 식품위생과 저장가공에 관한 조사·연구, 신진대사에 관한 연구,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지도 및 의뢰에 의한 음식물 분석·검정·감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생약과는 한약의 성분연구, 한약의 재배·시험·지도, 한약의 자원조사 이용에 관한 연구, 생약의 규격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하였다. 물리화학과는 합성화학·일반화학에 관한 연구, 특수화합물의 감정·분석·시험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현 화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법, 제약공업 재료에 관한 조사·연구 및 물리화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였다. 「중앙화학연구소 기구 및 사무분담표」, 『중앙화학연구소보고』 제5권, (1956. 10); 「韓國의 科學實態는 어떠한가(3) 中央化學硏究所」, 『동아일보』(1958. 6. 12).
「제약계에 서광, 멀티비타민 국내생산」, 『동아일보』, 1950년 5월 22일, 2면.
삼성물산은 수입약품의 전성시기를 이끌었고 마지막까지 의약품 수입을 지속했던 기업이었다. 삼성물산의 의약품 분야를 담당했던 김생기 전무는 퇴직 후 영진약품을 설립했다.
「국산제약계에 일대암영」, 『경향신문』, 1953년 8월 30일, 2면.
「국산의료약품의 제조실태」, 『경향신문』, 1957년 12월 2일, 3면.
「가짜 賣藥이 범람, 밀가루로 된 “산토닝”도 있다」, 『조선일보』, 1955년 3월 17일; 「賣藥 먹고 소녀가 변사, 면허도 없는 후암약방주를 구속」, 『조선일보』, 1955년 10월 26일; 「의약사고 날로 증가, 무면허 의사와 賣藥商 등 부주의로, 염산을 활명수로」, 『조선일보』, 1956년 8월 17일; 「주사 놓다 치사케한 두 매약상 허가 취소」, 『조선일보』, 1959년 8월 20일; 「摘發된 不正賣藥二千件」, 『동아일보』, 1956년 2월 16일; 「거리매약단속」, 『동아일보』, 1958년 7월 8일; 「120건을 적발, 부정매약업자 등」, 『동아일보』, 1959년 10월 27일; 「창녀를 등친 매약」, 『경향신문』, 1963년 3월 11일; 「떠돌이 매약단속」, 『경향신문』, 1964년 2월 5일.
미국의 대한원조는 1945년 9월 미군의 진주 이후 점령지역 행정구호원조(GARIOA)로 시작하였다. 미 육군부가 미군정을 통해 식료품과 의료품 등을 지원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한국과 미국은 원조협정을 체결하였고, 대한원조 책임은 미 육군부에서 경제협조처(ECA)의 원조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ECA 원조사업은 종료되고, 상호안전보장국(MSA)에 의한 군사원조와 유엔에 의한 구호원조로 이원화되었다. 유엔은 구호품목과 현지배급에 관한 책임을 유엔군 사령부에 일임하였고, 이러한 구호물자가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원조였다. CRIK는 유엔군 총사령부 보건후생부에서 운영하다가 1950년 12월부터 유엔군 사령부 산하의 유엔한국민사처(UNCACK)로 이관되었다. 유엔은 한국재건을 위해 유엔한국재건단(UNKRA)를 설립하였고, UNCACK과 함께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 MSA는 대외활동본부(FOA)로 개편되어 한국 원조를 시작하였다. 1953년 8월 미국은 보다 효과적인 원조운영과 CRIK, UNKRA 등의 원조를 조정하기 위해 유엔군 산하 주한 경제조정관실(Office of Economic Coordinator for Korea, OEC)를 설치하고, FOA를 포함한 모든 원조를 관리하도록 했다. 1955년 6월 미국의 원조책임이 FOA에서 ICA로 변경되면서 OEC는 ICA의 지시를 받았다. ICA의 원조는 1961년 9월까지 지속되었다. 1959년 7월 OEC는 주한미국 경제협조처(USOM)으로 변경되었다. 1955년 이후로는 미공법 480호(PL480)에 의해 미국잉여농산물이 원조되었다. 한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약 17년 동안 31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받았다(이현진, 2009: 47-53). GARIOA 원조 이래로 식료품이 가장 중요한 원조 품목이었지만, 의약품도 주요한 원조대상이었다. 의약분야의 원조는 CRIK와 FOA 등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CRIK와 FOA는 1954년과 1955년 의약구호물자 원조를 위해 매년 300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고, 의약품 및 시설재료 구입을 위해 1954년 240만 달러, 1955년 150만 달러가 사용되었다(보건사회부, 1958: 220).
「부정축재관리국 신설토록」, 『동아일보』, 1960년 6월 30일.
「ICA 民需弗 國債買入에 紛糾」, 『동아일보』, 1957년 5월 25일.
「ICA 물자구매자 추첨방식으로 선정」, 『경향신문』, 1955년 9월 22일; 「中小企業體 選定 一日關係者會合」, 『경향신문』, 1956년 2월 2일.; ICA 中小企業資金의 爭奪戰」, 『경향신문』, 1956년 3월 9일.
「산업인맥(27): 제약업(11)」, 『매일경제』, 1973년 4월 2일.
「ICA 민수시설 감사보고내용(중)」, 『동아일보』, 1958년 6월 17일.
「원조불 사용의 근본정신을 살리라」, 『조선일보』, 1957년 3월 16일; 「국민경제 좀먹은 ICA중소기업」, 『동아일보』 1960년 5월 27일.
「개가 드높은 우리 방역진, 뇌염병 원균을 遂發見」, 『조선일보』, 1949년 9월 16일; 「뇌염 왁찐 완성, 우리 방역진에 개가」, 『조선일보』, 1950년 6월 9일; 「뇌염방역에 개가」, 『경향신문』, 1950년 6월 10일; 「결핵예방은 우리 손으로(하)」, 『경향신문』, 1957년 12월 22일.
「페니시링 제조에 성공, 동양약품공업에 개가」, 『동아일보』, 1952년 12월 2일.
「요원한 제약회사 정리」, 『조선일보』, 1955년 12월 17일.
「시설개선이란 전도요원」, 『조선일보』, 1956년 6월 27일.
「제약회사 정비를 추진, 시설 갖춘 공장은 1할에 불과」, 『조선일보』, 1957년 10월 17일.
「설비기준 미달이 20개소」, 『조선일보』, 1958년 8월 20일; 「설비나쁜 제약회사 일제정리에 착수」, 『조선일보』 1958년 11월 12일.
「국산의료약품의 제조실태, 원료생산은 태무」, 『경향신문』, 1957년 12월 2일.
전후 1953년 2월과 196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이 있었다. 1953년에는 엔(円)에서 환(圜)으로 100:1의 비율로, 1962년에는 환에서 원(圓)으로 10:1의 비율로 화폐개혁이 단행되었다.
「藥局서 注射施療 甚之於藥劑師가 醫師行爲」, 『경향신문』, 1955년 2월 18일, 2면; 「摘發된 不正賣藥二千件」, 『동아일보』, 1956년 2월 16일, 3면; 「거리賣藥團束」, 1958년 7월 8일, 3면; 「誇張宣傳團束키로」, 『동아일보』, 1959년 7월 19일, 3면.
「의약품판매에 일언」, 『경향신문』, 1958년 10월 7일, 1면.
보령제약은 1960년대 진해거담제인 용각산, 1970년대 위장약인 겔포스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이승욱, 「보령그룹의 성장과 발전」, 『경영사학』31, 2003, 70-76).
「50년前 아로나민 개발후 영업까지, 회사 매출 4분의 1, 광고로 썼죠」, 『조선일보』, 2013년 10월 29일.
「일동 ‘아로나민골드’ VS 유한 ‘삐콤씨’」, 『약업신문』, 2009년 2월 25일; 「50년간 한국인 건강지켰다. 영양밸런스 생각한 비타민제」, 『동아일보』, 2013년 3월 27일.
「피로회복에 박카스디 광고」, 1964년 7월 10일; 「싱싱한 생명력, 박카스 광고」, 『경향신문』, 1964년 12월 9일.
「봄은 산에도 들에도 우리들 가슴에도, 박카스 광고」, 『경향신문』, 1966년 5월 2일.